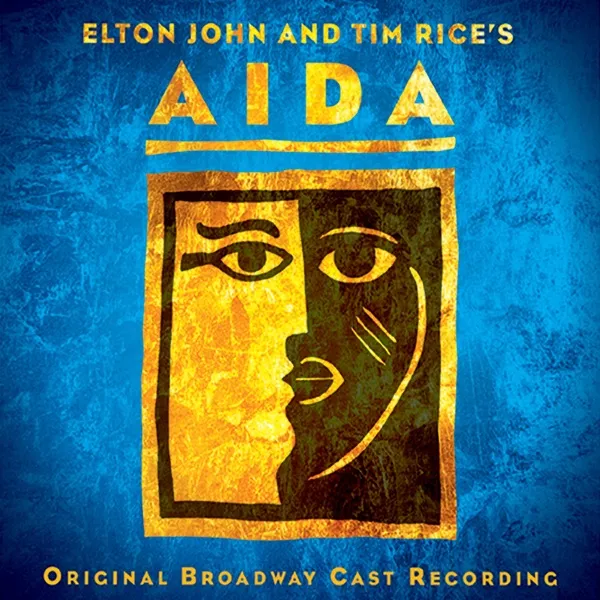엘튼 존은 창작의 비등하는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는 언제나 곡을 써왔다. 비록 히트차트 상위를 넘나들거나 비평의 호감이 없더라도 그가 주조해낸 멜로디의 샘은 일정 수준의 만족감을 제공해주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2001년의 < Song From The West Coast >와 2004년의 < Peachtree Road >는 미디어의 뜨거운 축복이 없었어도 막상 들으면 지금의 어떤 아티스트의 곡보다 실한 선율을 향수하게 된다.
그렇게 그대로 가도 된다. 하지만 '창작열의 화신' 엘튼 존은 관록의 평균미학에 흐르는 집중적 화력을 원했다. 그랜드 피아노의 터치도 '날각'과 총기가 배어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다. 전성기의 폭발력을 원형으로 되찾을 수 없어도 그 느낌만이라도 재생해냈으면 했을 것이다. 준거점은 그럼 무엇인가.
1975년 엘튼 존의 < Captain Fantastic & The Brown Dirt Cowboy >. 이 앨범은 엘튼 존과 필생의 콤비 버니 토핀이 당시 둘의 시선과 재능을 자전적으로 꾸려낸 전성기의 역작이다. (캡틴 판타스틱은 엘튼 존, 브라운 더트 카우보이는 버니 토핀이다) 히트는 한곡 'Someone saved my life tonight'에 불과했지만 'Tell me when the whistle blows' 'Bitter fingers' 'Tower of babel' 'Better off dead' 그리고 국내에서 널리 애청된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와 이어진 'Curtains'등의 레퍼토리들은 빼어난 짜임새를 보이며 곡마다 파워를 뿜어냈다.
앨범의 가공할 위용은 (지금은 흔해졌지만) 빌보드 사상 최초로 데뷔와 동시에 앨범차트 정상을 차지했다는 사실 하나가 충분히 웅변한다. 실로 엘튼 존이 1970년대 음악시장과 차트를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시기, 그 전성기 중에서 꼭짓점 시기에 위치한 기념비적 산물이다.
엘튼 존이 나이 예순을 바라보며 그려내고 싶었던 음악의 지평은 바로 그 앨범에 내재된 힘과 외형적인 대중 잠식의 재현, 재구성이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곡에는 관록과 파워가 교배되어야 하고 노랫말은 시공을 넘나드는 광대한 비유와 관점이 있어야 한다. 버니 토핀은 충분한 역량을 가진 파트너. 오히려 활활 불살라야 하는 것은 자신의 피아노연주와 멜로디 주조능력이었으며 정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닉네임이 된 '로켓 맨'을, '캡틴 판타스틱'을 재가동시켜줄 생산적 노욕(老慾)이었다.
< The Captain And The Kid >는 제목이 실증하듯 31년 전의 명작으로 돌아가 엘튼 존 자신의 '세기적 재능'을 부활시키고, 근간에 부재한 창작의 자긍심을 회복한 회심작이다. 멜로디는 핏기를 잃은 단순 나이테를 전달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살아 꿈틀거리며 'Postcards from Richard Nixon'과 'And the house fell down'이 전해주듯 피아노 음부터 하나하나가 찰지다. 그 연주는 마치 '생물' 같다.
'Tinderbox' 'Blues never fade away' 그리고 마무리이자 1975년의 녹음 패턴을 그대로 재현한 동명 타이틀이자 앨범의 결정타인 'The captain and the kid'는 엘튼 존이 여전히 긴장과 집중력만 충전한다면 추종 불허의 선율을 써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곡들이다. 아마도 1990년 개막 이후 엘튼 존의 곡 가운데에서는 가장 원기와 활력이 충만한 앨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신히 곡 숫자를 채우는 느슨한 풀 앨범이나 멜로디 재치만으로 나열한 싱글 모음집이 아니라, 앨범 전체를 하나의 컨셉 하에 플롯으로 엮고 스토리를 부여한 진정한 앨범이다.
아마도 이런 데는 근래 젊은 뮤지션들-시저 시스터스, 조스 스톤, 푸시캣 돌스의 킴벌리 등-과 교류하면서 간접적으로 젊은 피를 수혈한 덕분으로 보인다. 크레딧에도 '영감을 제공해준 시저 시스터스, 킬러스, 루퍼스 웨인라이트 등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조용히 앉아서 옛 영광의 트로피만을 바라보며 자족하고, 젊은 음악계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내는 늙은 거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청춘과 거친 호흡을 고르는 성실성이야말로 이 앨범의 인상적인 부활을 가져온 동력이다.
사실 근래 엘튼 존은 <아이다>와 뮤지컬 <라이언 킹>이 세계적 성공을 거둔데 이어 다시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음악을 맡고, 카메론 크로우 감독의 영화 <올모스트 페이머스>와 <엘리자베스 타운>을 통해 각각 'Tiny dancer' 'My father's gun'이 신세대와 접점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호사(好事)로 사기가 올라있다. 그 기운이 이번 앨범의 자연스러운 전개에 정서적 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버니 토핀은 1975년 < Captain Fantastic & The Brown Dirt Cowboy >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엘튼 존의 언어 분신이 되어 환갑을 앞둔 그의 삶, 갈등, 그리움, 타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관조 등 폭넓은 사고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그려내고 있다. 정확한 의미 전달은 쉽지 않지만 한곡 한곡이 절절한 리얼한 스토리 텔링이다.
마지막 'The captain and the kid'에서 그는 '돌아갈 수는 없고 노력해도 실패하지만 앞을 보며 무디어진 손톱이 보이고 진실을 판매한다는 표지를 본다. 우리가 한 것은 바로 이것이고 여기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 캡틴과 키드를 한 번 더 얘기할 뿐이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나이 들어감에 따른 무력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자신감을 한데 묶는 역설과 경계의 수사다.
그것은 '우린 모두 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죽는다.'는 'The bridge'에서 다리가 갖는 상징으로도 표현되며 'Blues never fade away'에서 그러한 경계는 여유로 해석되지 않고 비감(悲感)으로 묘사된다. '우리 어찌 이리 운이 좋은가/ 소총의 사정권의 타깃들인데/ 누가 콜하고 누가 선택되는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이며 누가 지게 될 것인가/ 그것은 슬픔의 배에 구르는 주사위/ 슬픔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곡에서는 존 레논에 대한 그리움도 살짝 스쳐간다.
< Captain Fantastic & The Brown Dirt Cowboy >가 나오기 전 엘튼 존은 자신을 너무도 인정해준 존 레논과 협연하며 각별한 우정을 쌓았다. 비틀스 시절 존 레논이 만든 명곡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를 그와 함께 리메이크해 전미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그 무렵 존의 노래 'Whatever gets you through the night'에 백업 보컬로 참여해 그 곡이 정상을 차지하는데 기여할 정도로 둘의 제휴는 당대에 이미 역사가 되어 있었다. 1975년 존 레논의 아들 숀의 대부가 되어주기를 약속했던 그가 어찌 고인을 잊을 수 있으랴.
엘튼 존의 피아노와 멜로디에 그치지 않고 버니 토핀이 쓴 가사를 총총히 살펴야 앨범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노랫말' 앨범이다. 전성기 때 “버니 토핀의 가사를 받아 곡을 써내는데 15분 이상이 걸리지 않는다!”고 호언할 만큼 곡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작곡 다음의 편곡 작업부터는 곡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 나이 서른이 되기 전의 활력에 (무모하게도!) 도전했다는 점이야말로 앨범에 감춰진 정신적 승리이자 쾌거다. 엘튼 존이 돌아왔다. 그 비등한 에너지가 돌아왔다.
-수록곡-
1. Postcards from Richard Nixon
2. Just like Noah's Ark
3. Wouldn't Have You Any Other Way (NYC)
4. Tinderbox
5. And the House Fell Down
6. Blues Never Fade Away
7. The Bridge
8. I Must Have Lost It on the Wind
9. Old 67
10. The Captain and the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