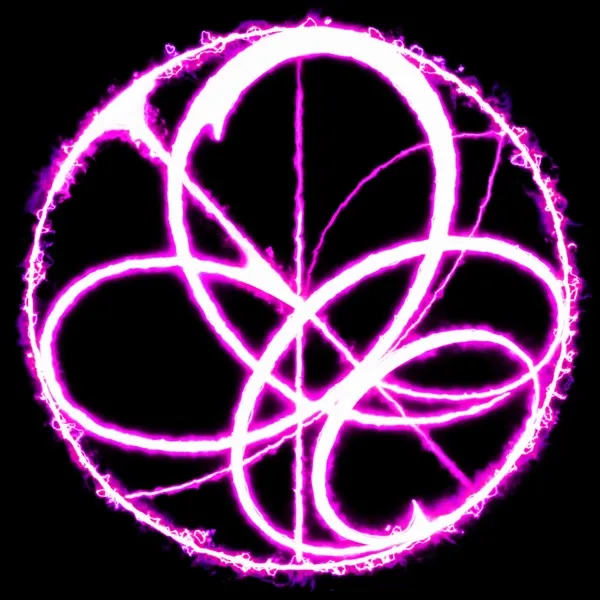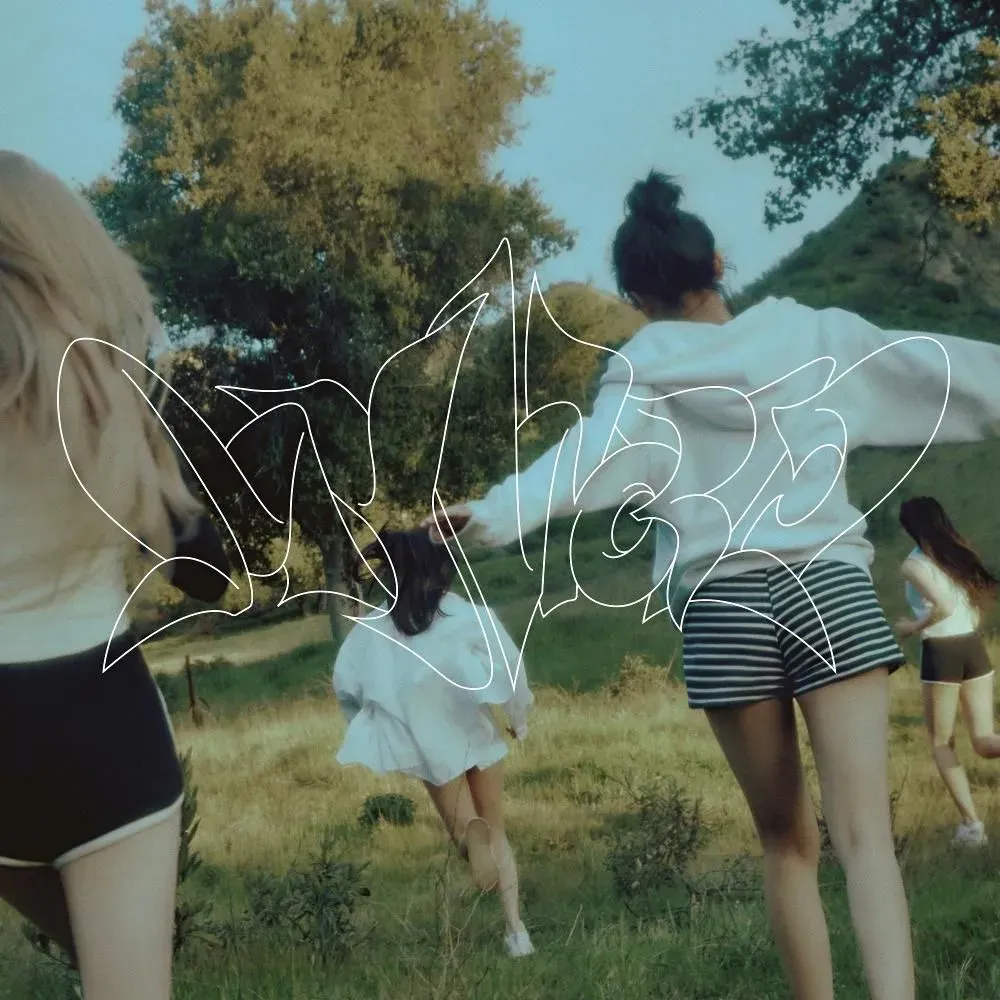모든 변화는 위험을 내재한다. 마냥 우상향만을 그릴 순 없다는 뜻이다. 에스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세계관’, ‘메타버스’, ‘쇠맛’, ‘흙맛’ 등 이들을 표상할 단어가 때때로 가속을 감행하면서도 변성하는 까닭은 애초 이들이 불안정한 토양 위 성공의 극대화를 겨냥하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에는 자본력을 포함해 그만큼 준수한 완성도와 확고한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을 설득할 실력이 기저에 있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 작년은 명실상부 에스파의 해로 남았다.
지난해 < Armageddon >과 < Whiplash >의 공식을 잇는 선택만이 상책은 아니다. 그러나 공허한 탈바꿈은 오히려 상기한 무기를 희석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2010년대 초중반 유행했던 래칫(Ratchet) 사운드의 울타리 속 자신의 곡 ‘Lingo’를 닮은 베이스와 엇박의 플럭 신시사이저로 일관하는 동안 멤버들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의존한 모습은 관성적 변형에 가깝다. 그렇다고 각 구성원의 보컬 퍼포먼스에서 환기를 느끼기엔 곡이 견고하지 못하다. 해보지 않은 것 중 해봄 직한 하나를 골라 우선 던져볼 수 있다는 여유뿐. 관능의 탈을 썼으나 실상은 한없이 방어적인 음악이다.